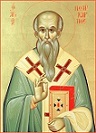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
얼마 전 칠십 대 초의 한 남자를 만났다. 매월 노령연금 20만 원과 생활지원금 15만 원 합쳐서 35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독특한 인생 경험을 한 것 같다. 삶에 쫓기던 그는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가난한 사람도 무시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사회주의가 궁금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초대소의 호텔 같은 좋은 방에 묵었다. 식사 때마다 열 종류가 넘는 반찬과 밥과 술이 나왔다.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반찬이 있었다. 매일 담배도 한 갑씩 받았다. 한가할 때면 국경도시 회령의 시내를 더러 산책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를 주면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탈북자가 있듯이 남쪽에서 북으로 온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월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북한 당국자는 그에게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평한 모습을 글로 써보라고 했다. 그는 글을 썼다. 그러나 매번 이 정도 밖에 쓰지 못하느냐고 핀잔을 받았다. 점차 시간이 가면서 반짝 친절이 식어가고 있었다. 아파트와 일자리를 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당에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았다. 다시 남조선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다. 판문각을 통해 다시 남으로 내려오기 한 달 전쯤이었다. 북한 당국자는 가기 전에 치과치료는 받고 가라고 했다. 그들은 무상 의료복지에 있어서는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치과에 가서 진료의자에 누웠을 때였다.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은 이들을 뽑아버려야 했다. 막 발치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북한의 치과의사가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양해를 구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네다. 여기는 마취제가 없습네다. 조금만 참으시라우요.” 치과의사는 생 이빨을 뽑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였다. 그가 고문을 한다고 소리치며 비명을 지르자 북한의 치과의사는 화를 냈다. 반죽음이 된 그는 잇몸만 가지고 한동안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본이 잘못 떠져서 틀니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화가 받친 그는 한번 초대소의 여자에게 “X년"이라는 욕을 했다. 그 말에 여자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나라가 조선의 종놈과 X년이 세운 나라인 걸 모릅네까?”라면서 덤벼들기도 했다. 판문각을 통해 다시 내려오기 전날에야 틀니가 완성됐다. 남한으로 내려오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그는 얼마 있지 않아 감방에서도 내쫓겼다. 밥 먹을 곳과 잠잘 곳이 없었다. 착한 교도관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그는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종교시설에 들어가 있었다. “가난한 인민의 낙원인 그곳에 계속 사시지 왜 돌아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 보았다. “낙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오십 년 전 우리 육십 년대 가난했던 생활 같아요. 옷소매가 기름때로 절어서 반질반질해요.” 가난한 자는 남과 북 어디에도 발 디딜 광장이 없는 것 같았다. “지금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나는 그가 추구하는 작은 행복을 알아보고 싶었다. “단순한 봉사라도 일할 자리와 원룸이라도 얻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ア 정치 계절이다. 사람마다 일을 할 자리가 있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이 정치권의 임무가 아닐까.〠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