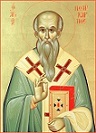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
일 년 전 일이다. 검사실 서기 앞에서 변호사로 입회를 하고 있었다. 조사라는 명목으로 서기의 모멸적인 언사가 한계를 넘자 한마디 항의했다. 그러자 서기는 이렇게 비아냥댔다.
“저는 변호사를 당장 내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을 아시죠? 한번만 더 입을 열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나무토막처럼 옆에 가만히 있을 거면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죠. 대한변협에 물어보세요. 우리 검찰이 규정을 그렇게 만드는데 찬성했으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였다. 검경의 실무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변호사를 언제든지 쫓아내는데 합의했다. 체포나 수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 규정을 만들 때 변협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 개개인은 고달픈 인생들이 많다. 자기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는 변호사가 ‘하우스 로이어’다. 남의 사무실에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늙은 변호사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치열한 경쟁사회다. 대신 양극화 현상이 왔다. 잘되는 대형로펌이 사건을 블랙홀같이 빨아들인다. 스타 변호사들이 부자가 되고 정관계로 진출해 성공한다. 그런 속에 대한변협이 있다. 그 변협은 부자와 가난한 변호사 중 누구를 대변해 왔을까. 또 국민에게는 무엇일까. 몇 년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장인 우쯔노미야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 개인변호사 때 야쿠자 사채의 폭리에서 서민을 구해주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에게 변협회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물었다. 그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간다고 했다. 변호사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 법정에만 안주할 수 없는 직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탈법을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을 법비(法匪)라고 혹평했다. 우리의 변협 내부를 구경한 적이 있다. 참 대단한 단체다. 똑똑한 변호사들이 1만 7천800명이나 모였다. 협회에 등록할 때 몇백 원씩을 받는다. 매 달 회비를 내고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세금같이 또 돈을 내야 한다. 협회는 능력이 있다. 선거 때면 최고급 호텔에서 고급 음식을 먹여준다. 그 안에 직함만 얻으면 해외여행도 여러 번 시켜준다. 거창한 이벤트들이 많다. 그 집행부의 철학이 궁금했다. 직접 보니까 집행부라는 단어가 공허했다. 회장 한 사람이었다. 이사들은 선거에 당선된 회장이 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사회를 해도 몇 명 참석하지 않았다. 대의원 총회를 해도 회장 의도대로였다. 회장 개인의 가치관이 변호사 전체의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협회장들은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이나 대형로펌의 오너출신이 많았다. 검찰서기 앞에서 함께 수모를 당하며 입회를 한 분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임명하는 이사들도 특이했다. 표가 많은 대형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를 이사로 보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의 내면은 검사가 많았다. 판사 출신은 법원에 대해 불편한 소리하는 걸 꺼렸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듯이 변협 안에 정작 변호사가 별로 없었다. 변협은 어때야 국민과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을까. 일선에서 변호사들이 실감한 정의를 이슈화해서 사회에 한마디 하고 정치권에도 한 줄의 법률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들이 형사 앞에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역대 대한변협회장들이 법치주의를 위해 들고 일어났다. 기대해 본다.〠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