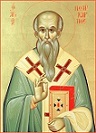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
어느 날 오후 이웃 사무실로 놀러갔다가 가슴 찡한 소리를 들었다. 은행지점장을 하다 퇴직한 남자가 묘목을 심고 나무를 옮기는 작업장에 일하러 갔다.
일당은 하루에 12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했다. 인부를 채용하는 작업반장이라는 남자가 그를 위아래로 한 번 쓱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내뱉었다. “이사람 보니까 팔에 근육도 없고 일당 5만 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12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지?” 노동 현장에서는 근육이 기준이었다. 왕년의 지점장은 무의미했다. 내 나이 또래의 자화상이다. 환갑을 넘긴 나는 도서관에 자주 간다. 도서관은 내게는 낚시터 같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장소다. 인생의 황혼에 묵묵히 종이 냄새 나는 서가 앞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노년의 여유다. 시집들을 많이 읽는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이 맑고 투명한 삶의 감동들이 압축되어 있다. 가슴이 찡하는 시 한편을 낚았다. 젊어서부터 도자기를 굽는 시인이 있었다. 흙을 빚어 불 속에서 생명력을 탄생시키는 예술에 그는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삶은 돈과는 인연이 멀었다. 장이 서는 날 그는 생활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전을 펴놓았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도 그가 만든 작품을 사가는 사람이 없었다. 오후가 들어 한 잎 두 잎 펄럭이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파장할 무렵 그가 앞에 늘어놓은 생활도자기 안에는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있던 동태장수에게 도자기와 생선을 바꾸자고 제의했다. 사람 좋은 생선장사는 허허 웃으며 도자기 세 개를 받고 동태 12마리를 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 밥상에 동태전과 동태찌개를 올려놓았다. 늙은 어머니는 오랜만에 먹고 싶던 동태를 실컷 먹었다고 아들의 등을 갈퀴 같은 늙은 손으로 두드려 주었다. 가난이란 그런 건가 보다. 조병화 시인의 시에서도 가난을 읽었다. 평생 시를 쓰던 시인의 처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시에서 암을 죽음의 대기표라고 표현했다. 아내의 빈 방을 보며 시인은 울먹였다. 평생 시를 썼지만 원고료가 아내 주사 한 대 값도 안 되더라고. 아내를 보내고 홀로 살던 시인은 세상길 사는 노자가 다 떨어져 가는데 저승사자가 늦게 올까봐 조바심을 시에 담고 있었다. 죽어서는 휴지조각만도 못한 돈이 산 사람에게는 생명이었다. 그러면 부자는 안락할까. 변호사인 나는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평생 천 억을 만든 부자 영감을 보았다. 줄 돈을 주지 않고 받을 돈은 목숨을 걸고 받았다고 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모았다. 음식점에 가서도 그는 남이 남기고 간 소주를 슬며시 가져다 마셨다. 증권사에서 선물한 조기꾸러미가 그에겐 더 없는 횡재였다. 부자라고 해도 평생 양복 다섯 벌 구두 다섯 켤레를 채우지 못했다. 쓰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부자가 된 후 그에게 희귀병이 다가왔다. 죽음을 가지고 오는 병이었다. 주위에서 하이에나 같이 눈에 불을 켜고 그의 돈을 노렸다. 그는 병보다 돈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번 돈들을 불에 태워버리거나 바다에 던져 버리고 갔다. 진정한 마음이었다. 그는 한 푼 쓰지 못하고 평생 번 돈을 진짜 버리고 갔다. 죽은 그에게는 아름다운 시도 꿈의 도자기도 없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돈 때문에 속을 썩이다 죽는다. 어떻게 살아야 낮은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주님은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게 기준인가 보다. 며칠 후 이웃 사무실의 정 집사에게 인부 모집에서 쫓겨났던 퇴직한 지점장의 그 뒷얘기를 들었다. 그는 하루에 팔굽혀 펴기 2백 개씩 연습해서 근육을 키워 드디어 12만 원 일당을 받는데 성공했다는 말을 전했다.〠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