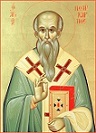루게릭병 환자가 전하는 메시지
엄상익/크리스찬리뷰 | 입력 : 2019/10/30 [15:47]
법을 공부하던 가난한 청년이 루겔릭 병에 걸렸다. 몸이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병동 창가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창턱에는 그가 공부하던 손때 묻은 두툼한 민법, 형법, 헌법책이 놓여 있었다. 진정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의 경전들이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면 그는 침대에 앉아 법서들을 공부했다.
점점 몸이 굳어갔다. 그는 그 상태에서도 간병하는 여성에게 눈 앞에 책을 들고 있어 달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다.
시험에 합격하고 앞에 넓은 초원이 펼쳐진 친구 몇 명이 병문안을 왔다. 건강한 그들이 돌아간 후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절규한다. 점차 온몸이 석고같이 굳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갔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의 뺨에 앉았다. 그는 파리를 쫓기 위해 얼굴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한다. 한 방울 눈물이 뺨 위로 내려온다.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우연히 저녁에 혼자 앉아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다.
젊은 시절 법서를 들고 산골짜기 암자나 강가의 방가로에서 공부를 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 주인공의 심정을 절실하게 공감했다. 인간은 하나하나 잃어갈수록 평범했던 것들이 미치도록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소설가 정태규 씨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실제 인물이라는 걸 알았다.
199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당선한 그는 어느 날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다. 목디스크인 줄 알고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루겔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휠체어를 타게 됐고 목구멍이 굳어 위에 구멍을 뚫었다. 그래도 그의 글은 계속됐다. 어눌한 발음을 그의 아내가 받아 적었다. 그마저 안 되자 종이 글자판을 만들어 아내가 자음과 모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가 눈을 깜박여 신호를 만들어 문장을 완성했다.
문인들이 돈을 모아 병든 그에게 안구 마우스를 선물했다. 눈동자는 그를 작가로 살게 하는 마지막 근력이다. 그의 글들은 그가 흘려내는 영혼의 맑은 눈물이다. 그는 세상에 어떤 걸 알리고 싶은 것일까. 그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삶도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랑 수제 맥주 한 잔하고 자두를 와삭 씹어 먹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학에 대해 이런 생각을 전한다.
“소설은 제법 진지한 혼자 놀기이며 자기의 존재 증명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기사를 읽으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오래 전 거리를 지나가다가 벽에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행복입니다.”라는 글귀를 본 기억이 떠오른다. 요즈음에야 공감이 되는 말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던 내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밤하늘이 영롱한 별을 볼 수도 있다. 또 바닷가에 데리고가 하얀 갈기를 얹고 다가오는 푸른 파도를 볼 수도 있다.
눈물로 쓴 작가가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아닐까. 기사의 한쪽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작가의 모습이 작은 흑백사진으로 나왔다. 그는 죽음 직전 열린 하늘을 보고 미소 짓는 성경 속의 스데반처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