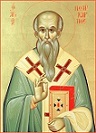물오른 미루나무 줄기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 강원도 양구 미석예술인촌을 출발해서 세 시간 남짓, 우리는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작고 아늑한 진입로는 제법 편안한 풍치를 준다. 화접도 부채 든 선비 같다.
아들 진흥이와 나는 드디어 '문학의 집·서울'에 안착했다. 숨 돌릴 틈없이 화가의 눈으로 꼼꼼히 더듬어 보아야 한다.
창신동 유년 시절, 이곳은 한치 건너 두치보다 더 가까웠던 나의 안방 아랫목이었다. 어린 나를 유년답게 해줬고 청년답게 자라게 해주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나만의 다짐을 고스란히 담아두었던 타임캡슐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행이다.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나는 스스로 안도하며 의연해진다.
나의 기억으로는 전차가 다니던 서울 사대문 밖은 뒷간 배설물들이 길을 더럽히곤 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끔찍했다. 나는 야경꾼 방망이 소리에 곤한 잠을 밀치고 일어나 집 마당부터 쓸곤했다.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듣고부터는 신이 나서 온 동네를 안방 치우듯이 단숨에 씩씩하게 쓸어내곤 했다.
아직 어둠이 묻은 싸리 빗자루에 오물이 걸리는 날이면 나는 질겁하며 투덜대곤했다.
“으씨, 난 언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아이한테 상을 꼭 줄 거야.”
아버지 초상화 같은, 전래동요 같은 우리집이었다. 장마철이면 온통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 세간들은 난리법석이었다. 철모르는 세숫대야며 흥이난 장독들이 수양버들 늘어지듯 얼씨구절씨구 넘실넘실 둥둥 떠다녔다. 뒤집어질세라 온 식구는 그것들을 부둥켜안고..., 그야말로 댄스 교습소가 따로 없었다.
장마가 걷히면 나는 냇가 모래를 세숫대야로 끙끙거리며 날랐다. 부엌과 마당에 있는 오물을 아버지가 걷어내시면 나는 그 자리에 모래를 부었다. 아버지가 성큼성큼 밟아내시면 모래톱 높이만큼 우리집은 전래동요처럼 새집이 되곤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당시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애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자연에 대한 동경과 감사와 귀소본능이 또한 샘솟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괜스레 겸연쩍고 부끄러워진다. 그래도 그때 성남이가 나는 자랑스럽고 지금도 나의 전부가 오도카니 깃들어 있는 그때가 매우 그립다.
“성남아, 제비가 알을 까면 풍년이 온단다.”
아버지 음성이다. 여백 같은 자리에는 아버지 그림이 늘 위치해 있다. 아버지 그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신다. 그림 그리기에 난처해질 때면 나는 아버지 그림을 본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남아! 봄을 그리면 겨울 냄새가 니야 되지 않겠니?”
투박한 듯 따뜻한 음성으로 오히려 나에게 물어 오신다. 같은 길을 가는 나에게는 스승이자 바이블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찾고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내 아들에게 같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파 몸부림친다.
대문이 없다. 새하얗게 단장한 '문학의 집·서울'은 금새라도 한 편의 시가 될듯 나를 뭉클케 한다. 입구에 서있는 ‘옛 중앙정보부장 공관’, ‘서울미래유산’ 안내 문구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그 모습은 찾을 길 없다.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 했는데 새털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참새 몇 마리 옹기종기 한가롭기까지 하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남산에서 아들과 함께 그림 전시를 하다니.... 진흥이가 힘들면 찾아갔던 국현 할아버지와 손자 그림이 문득 떠오른다. 혹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시려나?
어머니 무쇠 손과 우람한 아버지 손이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하시면 다가오신다.〠
박성남|화가, 본지 아트디렉터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