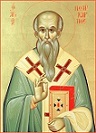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
넓은 초원에 깊은 구덩이가 있다.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 외롭고 춥고 어둡고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변호사란 직업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십 년이 훨씬 넘은 그에 대한 메모를 보았다. 머리의 깊은 곳에서 그에 대한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는 작은 가게를 얻어 전자제품을 팔고 있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돈에 쪼들리자 사채를 얻어 썼다. 사채업자는 그의 발행 명의로 된 수표를 받아두었다.
사채 이자는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도망을 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돈을 가족에게 보냈다. 그가 없어지자 사채업자는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 예금잔고가 없을 때 은행은 기계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법원은 부도난 수표에 대해 컨베어벨트에 실려 옮겨가는 제품의 처리처럼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항변이 통하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은 그걸 올가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법은 개인 사정보다는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하는 수표의 신용보장을 더 중시했다. 그는 수배자가 되고 체포됐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사채를 갚아야만 수표를 회수하고 석방이 될 수 있었다. 돈이 없는 그는 변호사도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칼 가는 소리를 내며 성동구치소의 높은 콘크리트 담을 스치고 지나가던 날이었다. 그 담장 한 귀퉁이의 낡은 면회실 마당에 팔십 대쯤의 노파가 몸을 웅크린 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엷은 귀가 먹어 죄수 번호와 방 번호를 알려주는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찬바람을 타고 스피커에서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내렸다. 노파는 못 들었다. 방송이 세 번 반복되고 있었다. 면회를 기다리던 옆의 여자가 우연히 노파의 손에 들려있는 쪽지의 대기 번호를 보고는 노파에게 구석방으로 가라고 급하게 손짓을 했다.
노파는 구석의 면회방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력을 다해 걷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곧 넘어질 것 같이 위태한 모습이다. 노파는 간신히 면회방의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두툼한 플라스틱판을 가운데 두고 노파와 오십대 말쯤의 아들이 마주 앉아있다.
“아, 아무도 모르게 왔어.”
노파의 말이 이 사이에서 샌다. 중풍기가 있는 것 같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데 오세요? 제대로 동네길도 다니지 못하시면서 돌아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앞으로 제발 오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어조에 진한 걱정이 배어있다. 딸네 집 구석방에 얹혀사는 노파는 치매기마저 있었다.
“네, 네가 보고 싶어 왔어. 어—어—쩐지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건지도 몰라”
“제발 이제는 오지 마세요”
아들은 말을 맺지 못하고 통곡한다. 노파의 눈가도 벌겋게 짓물러 있다. 일생 흘린 눈물이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했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입은 누런 죄수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걸 볼 때면 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한 번은 라디오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다. 진행자는 자기가 아는 법을 줄줄이 말하면서 내 의견을 물었다.
“법에도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법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진행자는 아니꼽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위선을 부리거나 건방을 떠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신성하게 여겨져 왔다.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요즈음은 술집 상 위에서도 입법안이 만들어진다. 그걸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큰 일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만든 법에는 영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내가 마주친 구체적 상황들을 작은 글로 만들어왔다. 거기에 변론서나 진정서, 탄원서라는 적당한 제목을 붙여 법원이나 검찰등 공공기관에 제출해 왔다. 그게 세상에서 맡은 작은 역할이었다.
나의 작은 그릇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글로 써서 민들레씨가 허공으로 날아가듯 인터넷의 하늘로 띄워 보냈다.
그 작은 씨가 사람들의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엄상익|변호사, 본지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