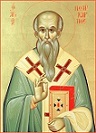|
법정에서 살인범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60대 쯤의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 퍼런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변호사석에 있는 나를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나 죽은 여자의 애비 되는 사람인데 당신 그러면 안 돼.” 피해자의 아버지였다. 그와 함께 온 직장동료인 듯한 사람들의 차디찬 눈길이 나의 온 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죽여야 할 죄인을 두둔하는 악역인 셈이었다.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슬며시 화가 치밀었다. 변호사인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죽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그의 말을 맞받아 쳤다. “여기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 제가 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인범이라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 재판이 방해 받아야 합니까?” 방청석이 술렁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 복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시비를 걸고 곧 폭행이라도 할 기세였다. 순간 나는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결혼한 딸이 살해됐다. 범인은 남편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변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죽이고 싶은 증오가 솟아날 게 당연했다. 변호를 하면서 나는 외눈박이였다. 피해자 측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돈만 보였었다. 다른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아이를 깔아 죽여도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을 뿐이다. 가책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미워졌다.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의 감별 방법은 간단했다. 피해자에 대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면 그래도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변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곤 한다. 변호사가 무심히 써서 보내는 소장은 상대방의 가슴에 칼날이 되어 박힌다.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고소는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폭탄이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쓰는 준비 서면의 한 줄이 부부 사이의 감정을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하기도 한다. 의뢰인을 위해서 뭐는 못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서비스를 해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변명도 해 본다. 변호사라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세상의 미움을 덜 받지 않을까? 〠 엄상익|변호사, 크리스찬리뷰 한국지사장 <저작권자 ⓒ christianrevie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